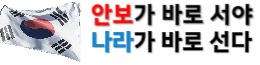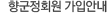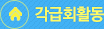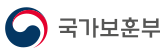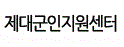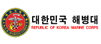| 제목 | 고 김용배 장군에 대한 조선일보 양상훈 칼럼 | ||||
|---|---|---|---|---|---|
| 등록자 | 문경시재향군인회 | 등록일 | 2013-07-11 오전 10:10:14 | 조회수 | 837 |
| 매년 7월 경북 문경에선 특별한 제사가 열린다 압록강까지 진격했던 김용배 대대장을 기린다 압록강에 섰다 스러져간 7연대 젊은이들을 생각한다 양상훈 논설위원 며칠 전 어느 자리에서 6·25가 화제가 됐다. 경상북도 문경 출신인 한 분이 처음 듣는 얘기를 했다. 매년 7월 문경시(市)가 6·25 때 연대장으로 전사한 김용배 장군의 제사를 지내고 있다고 했다. 그의 말로는 문경 출신인 김 장군은 6·25 중 전투 현장에서 전사한 유일한 연대장이라고 했다. 솔직히 김용배라는 이름을 처음 들었다. 우리는 우리가 피 흘렸던 전쟁을 너무 모른다. 한편으로는 국민 대부분이 알지 못하는 한 군인을 위해 고향에서 시민들이 제사를 지내주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자료를 찾아보니 6·25 때 압록강에 가장 먼저 도착한 국군 부대는 6사단 7연대였다. 1950년 10월 26일 압록강 물을 수통에 담은 병사도 7연대 소속이었다. 그 7연대의 선두에 선 제1대대의 대대장이 바로 김용배 중령이었다. 김용배는 6·25 발발부터 압록강까지 그리고 전사할 때까지 전 기간을 최전선에서만 보낸 사람이었다. 전쟁 발발 이래 패주만 거듭하던 국군이 사실상 처음으로 거둔 승리도 김용배의 7연대가 50년 7월 충북 음성에서 거둔 승전이었다. 김용배는 1951년 7월 2일 7사단의 연대장으로 강원도 양구 토평리 지역에서 중공군과 고지전을 벌이다 적의 포탄을 맞았다. 그의 나이 불과 30세. 일제강점기에 태어나 강제 징집을 당했고, 귀국해서도 전화(戰禍)를 몸으로 막아야 했던 기구한 삶이 끝나는 순간이었다. 정부는 그를 육군 준장으로 특진시키고 태극무공훈장을 수여했다. 김 장군에 대한 자료를 더 얻으려 인터넷을 뒤지다 ''유용원의 군사세계'' 사이트에서 ''울프독''이란 필명을 쓰는 분이 올해 문경시의 김 장군 제사를 다녀와 남긴 글을 보게 됐다. 제목은 ''압록강 진격 대대장을 제사 모시는 고향민들''이었다. 글에 따르면 수년 전 문경시장이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김 장군 흉상을 보고 조사를 시작한 것이 ''김용배''가 고향에서 다시 살아나게 된 시작이라고 했다. 그 글과 함께 실린 제사 사진 속에서 어디서 본 듯한 사람을 발견했다. 백발의 그 인물은 마이크 앞에서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다. 설명을 보니 이대용 장군이라고 했다. 베트남 공사(公使)로 있다 베트남 패망 후 붙잡혀 5년간 갖은 고초를 겪었으나 끝까지 버티고 생환한 그 사람이었다. 1950년 10월 26일 김용배 7연대 1대대장은 압록강에 가장 먼저 도착한 휘하 중대장으로부터 무전 보고를 받았다. "제1중대, 14시 15분, 압록강 도착!" 그 무전을 날린 사람이 바로 이대용 제1중대장이었다. 이씨가 당시를 회고한 글을 읽어보니 7연대는 중공군 개입 소식을 듣고 압록강서 후퇴하다 평안북도 초산에서 중공군과 마주쳤다. 압도적으로 우세한 적의 야습(夜襲)으로 7연대는 점차 무너졌다. 전투 중인 이대용을 김용배 대대장이 급히 불렀다. 이대용은 죽음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두 사람이 나눈 짧은 대화를 이렇게 전했다. "제1중대장 이 대위 왔습니다" "제1중대는 여기서 별명이 있을 때까지 적을 막아내도록 해!" 그렇게 명령한 김용배는 그 자리에 반듯이 누워 밤하늘을 보았다고 한다. 이대용은 ''대대장이 이곳을 무덤으로 생각하는구나'' 하고 느꼈다고 했다. 그러나 두 사람에게 그곳이 무덤은 아니었다. 모두 탈출해 전투를 이어갔다. 특히 이대용은 중대원 180명을 이끌고 중공군과 싸우고 피하며 산속을 달린 끝에 사단으로 귀환했다. 살아남은 병사는 20여명뿐이었다. 중대가 이동한 거리를 다 합치면 400㎞가 넘는다고 한다. 뚫으면 포위당하고, 또 뚫으면 또 포위당하면서 이대용은 자결을 생각했다. 이미 연대의 여러 장교가 자결한 뒤였다. 이대용이 권총을 빼 드는 순간 누군가 "안 됩니다!" 하고 외쳤다. 그의 운명이 바뀌는 순간이었다. 이 바뀐 운명으로 이대용은 지금 김용배의 제사에 참석해 그를 추모하고 있다. 국군은 너무 빨리 압록강까지 진격했다. 전선을 정비하면서 진격했으면 중공군에 후방을 차단당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랬다면 압록강에 끝내 이르지 못했을 것이다. 그 진격이 무모했건 아니건 국군 병사들이 압록강에 서 있는 장면을 상상하면 가슴이 설렌다. 통일이 우리 곁에 잠시 왔다 간 그 순간이 마치 오래전에 이별한 연인처럼 그립고 안타깝다. 전쟁기념관에 압록강 물을 담은 수통이 전시돼 있다. 그 물을 담았던 병사의 운명은 어떻게 됐을까. 그 장면을 카메라에 담았던 병사는 곧 전사했다. 그때 압록강에 섰던 7연대 병사들은 그 후 며칠 만에 상당수가 전사한다. 그래서 그 수통에 담긴 것은 물이 아니다. 한(恨)과 피다. 짧은 시간이나마 통일을 제 힘으로 이룩했던 그들, 눈을 감으며 통일을 떠나보내야 했던 그 운명들을 생각한다. 생(生)과 사(死)가 갈린 대대장과 중대장이 제사 자리에서 만나게 된 운명을 생각한다. 누군가는 압록강의 7연대와 스러져간 젊은이들을 기억했으면 한다. | |||||
이전글이 없습니다.다음글이 없습니다.